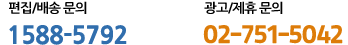전기차·하이브리드·고성능 디젤 속속 나와 … 자동차 업계 사활 걸어

▎도요타 프리우스는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
|
도요타자동차는 1997년 야심작 프리우스를 시장에 내놨다. 친환경적인 기능을 강조한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는 1L의 연료로 보통 자동차보다 2배 넘는 거리를 달렸다. 출시 당시 일본 기준 연비는 L당 28㎞였다. 언론과 사회단체는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라며 프리우스를 극찬했다.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반응은 달랐다.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디젤 차량이 연비와 가격 면에서 앞선다고 판단했다. 독일·프랑스 주요 메이커들은 고성능 디젤 엔진 개발에 주력해 연비가 L당 20㎞가 넘는 디젤 차량을 내놨다. 하지만 유럽 메이커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자원과 환경 문제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에코 카’로 바뀐 것이다.2009년 프리우스 판매가 200만대를 넘어설 무렵 벤츠·포르셰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친환경 차량 개발이 더 늦은 미국의 GM·포드·크라이슬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룬 미국 메이커는 고성능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를 내놓으며 친환경 경쟁에 뛰어들었다.100% 순수 전기차로 나오는 여러 제품 가운데 비교적 고효율로 알려진 닛산의 리프(Leaf)는 1회 충전 후 최대 주행거리가 160㎞ 내외다. 중국에서 개발된 BYD 전기차는 200㎞를 달린다. 기아자동차 쏘울 EV도 한번 충전으로 200㎞를 달릴 수 있다. 미니(Mini) E 전기차도 150㎞ 내외의 거리에서 주행할 수 있다. 내연 기관 엔진을 동력발생 장치로 사용하면 한 번 주유로 600~700㎞ 내외를 가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유럽 제조사도 하이브리드 개발전기차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중량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내연기관의 연료탱크에 해당되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배터리다. 연료통이 크면 기름을 많이 저장할 수 있지만 중량도 그만큼 증가한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다.전력 저장용량이 커지면 크기와 무게가 덩달아 늘어난다. 이 경우 오히려 지나친 중량 부담이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kWh의 전력을 확보하려면 약 12㎏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한번 충전으로 300~400㎞를 주행하려면 배터리 무게만 360~480㎏에 달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100% 순수 전기차로 속속 등장하는 전기차의 1회 충전 평균 주행거리가 200㎞ 내외에 머문 이유다.그래서 100%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Range Extented EV)’다. 모터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보조 동력으로 소형 엔진을 장착하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려 놓은 전기차다. 순수 전기 동력만으로 200㎞ 이상을 달리기 어려운 만큼 화석연료를 쓰는 엔진과 전기를 혼합한 형태다.기본 구동은 전기로 하되 전력이 바닥나면 연료를 태워 엔진을 구동시킨다. 이 때 작동하는 엔진은 직접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한다. 그야말로 소형 화력발전소를 자동차에 탑재한 셈이다. 대표적인 차가 쉐보레 볼트다. 최대 600㎞ 넘게 주행할 수 있다. 최근 제조사들이 앞다퉈 내놓는 전기차의 대부분이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다. 100% EV는 아직 실용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주행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하이브리드에 전기 구동 범위를 넓혀 놓은 차도 있다. 도요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가 대표적이다.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충전하되 배터리 전력이 방전되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600㎞ 넘게 주행할 수 있어 100%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모델이다.전기차의 등장은 이전에도 지속된 고효율 경쟁의 가속화를 부추겼다. 월 1500㎞ 를 주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L당 2000원이 넘는 휘발유와 수요 확대로 가격이 오르는 경유 소비자에게 전기차 유 지비용은 그야말로 매력적이다.이런 이유로 디젤에 매진한 제조사들도 점차 하이브리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이브리드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가솔린 외에 디젤 엔진으로도 확대 적용한다. 푸조와 시트로엥의 디젤 하이브리드는 L당 26㎞가 넘는 고효율을 자랑한다. BMW와 벤츠도 디젤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아 고효율 전략을 확대했다.디젤 하이브리드의 걸림돌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이다. 가솔린 엔진보다 고가의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데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결과 전기차에 버금가는 가격이 나온다. 따라서 디젤 하이브리드도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소비자가 사기어려울 수밖에 없다.디젤 효율이 오를 때 가솔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점차 전기의 역할이 늘어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배터리의 전력 저장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 하이브리드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도요타 ‘프리우스’는 세대가 진화될수록 효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1세대와 지금의 3세대는 L당 주행거리 차이가 7㎞에 달한다. 통상 1㎞의 효율을 높이려면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실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도 L당 35㎞(일본 기준)에 이르는 효율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보편화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전기차·디젤 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고효율 경쟁을 펼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연소율과 경량화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 받는 분야가 자동차 다이어트이다. 방법은 소재 변경이 대부분이다. 무거운 철 대신 복합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의 비중을 키우는 방식이다.BMW가 전기차 i3를 내놓으며 탄소섬유복합플라스틱으로 차체를 구성했다. 랜드로버는 알루미늄을 선택했다. 비싼 소재임에도 ‘효율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손잡고 신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는 배경도 결국은 ‘고효율’ 때문이다.신소재 개발 배경도 고효율고효율은 자동차 회사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의무이자 생존의 필수 항목이다. 고효율이 곧 친환경을 의미해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한국이 2015년까지 자동차 평균 효율을 L당 2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직접적인 배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다. 물론 제조사가 고효율 자동차를 내놓으면 소비자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효율 기술 적용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여서 논란이 되지 않는다.다시 말해 환경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고효율을 추구하지 않으면 완성차 회사의 생존 자체가 어렵다. 배기량 크기를 줄이면서 터보차저를 덧대는 이유도 고효율 때문이다. 전기차,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등이 세상에 고개를 내민 공통된 이유가 바로 고효율이다.주행거리 연장 전기차(Range Extented EV) 모터가 메인 동력이고 보조 동력으로 소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다. 순수 전기 동력만으로 200㎞ 이상을 달리기 어려운 만큼 화석연료를 쓰는 엔진과 전기를 혼합시킨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