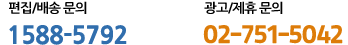국립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독일 극작가 쉴러의 ‘떼도적’.공연예술 전통이 튼실한 유럽에서 단체나 공연장에 ‘국립’ 타이틀을 달면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 관객의 기대 수준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여느 단체(공연장)와는 다르다. 이런 공간과 단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나’ 늘 고민한다. 활동 여건이 좋은 만큼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국립’도 수없이 그런 고민을 한다. 그래서 의무감을 갖고 남이 쉽게 못하는 작업에 매달리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격을 보여 주고자 심혈을 기울인다. 결과는? 뭉뚱그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때는 노력 자체가 가상한 경우가 있다. 남이 못하는 시도 자체도 관객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